
2019년 계간 《가온문학》 봄호 ‘가온이 발굴한 시인’에 「그 바다의 뒷모습」등을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한 김이담 시인의 첫 시집이다. 일찍이 대전 고교연합 문학 동아리 ‘동맥’의 1세대로 활동한 바 있는 시인은 “노동현장에서 밥을 빌며 세월을 파먹었으나 시는 나의 운명, 다시 시가 내게로 왔다.”(시인의 말)고 한다. 거미가 “일생 창자를 녹여/실로 엮은 집”을 짓듯 객지의 바람골목을 떠돌며 오랜 담금질로 지어 올린 그의 언어 감각과 상상력은 편편히 밀도가 깊다. 설움도 눈물도 마른 소금꽃처럼, 피와 울음을 말린 북처럼, 인간의 삶에 드리워진 절절한 아픔을 녹여내 자연 이치로 되돌아보는 시세계가 오롯이 담겨 있다.
시인은 늦깎이로 첫 시집을 출간하는 소회를 이렇게 전한다.
“‘첫’이란 말, 눈물겹다. 이제야 첫 시집이라니! 젊은 날은 김대현 시인, 박용래 시인 등 대선배들의 등 뒤를 졸랑졸랑 따라다니며 시인이 아니면 아무것도 않겠노라 큰 소리 친 날도 있었다. 그러나 목구멍만큼 무서운 것이 또 있으랴. 나는 배가 고파 노동현장에 뛰어들어야 했고 그리고 돌고 돌아‘첫’이란 말과 마주 앉았다. 울컥, 목구멍에서 무언가 치민다.
가난하고 쓸쓸한 우리 사회의 변두리 사람들, 그러나 결코 기죽지 않고 살아가는 이 땅의 이야기를 써 보고 싶었다. 자본이 아닌 자연에서 그들 삶을 투영해 보고 싶었고 때로는 의미를 배제한 자연 그 자체의 그림을 그려보고도 싶었다. 내 어릴 적만 해도 조그만 일이라도 마을이 온통 나서서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도시화, 산업화란 미명 아래 사람의‘사이’는 멀어지고 개인주의만 팽배해졌다. 어찌하랴, 나는 그것을 독자들과 함께 다시 자연에서 배우고 복원해야 한다고 감히 생각해보는 것이다. 공감하는 독자들이 단 몇이라도 있다면 그 작은 물결이 바다를 출렁이게 할 것을 믿는다. 우리도 옛 사람들처럼 서로 기대 사는 삶이라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오홍진 평론가는 해설을 통해 “김이담의 시는 사물 속에서 자연의 오롯한 이치를 발견하는 시심과 그것을 가로막는 삶의 비애 사이에서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다”며 “인간은 자연을 지우지만 자연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과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 김이담의 시는 이러한 공생의 세계관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김이담의 “자본의 바깥을 사유하는 시 정신”, “약자들과 더불어 걷는 길 위에서 발견하는 사랑의 시 정신”에 주목한다.
김신용 시인은 추천사를 통해 “그의 시는 결코 현실에 무릎 꿇지 않는 꼿꼿함과 따뜻함을 잃지 않는다. 가난한 가계사와 삶의 시간들이 매 시편마다 슬픔처럼 배어 있으면서도, 결코 멈추지 않고 아픔과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온 사람들의 서사가‘발묵’처럼 번져 있다. 도저히 첫 시집 같지 않은 그의 언어 감성은 다시 먼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의 위로가 되어준다.”고 말한다.
■ 추천사
김이담 시인은 생활의 시인이다. 일을 하면서 시를 쓰는 시인이다. 고단한 노동의 시간에도 틈만 나면 책을 읽고 시를 쓰는 시인이다. 그의 시는 소박하다. 어질고 착한 심성을 가진 그의 조용한 인품만큼이나 그의 시들도 정갈한 소반에 차려진 소찬 같다. 그런 그의 시를 읽고 있노라면 입 안 가득 풀향이 고인다. 살아온 지난한 시간들, 한 생을 이어져 온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그의 시는 결코 현실에 무릎 꿇지 않는 꼿꼿함과 따뜻함을 잃지 않는다. 가난한 가계사와 삶의 시간들이 매 시편마다 슬픔처럼 배어 있으면서도, 결코 멈추지 않고 아픔과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온 사람들의 서사가 ‘발묵’처럼 번져 있다. 그의 맑은 심성에서 번져 나오는 이미지들은 읽는 이들의 마음까지 씻어준다. 도저히 첫 시집 같지 않은 그의 언어 감성은 다시 먼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의 위로가 되어준다. 아마 아무리 걸어가야 할 길이 멀고 고달프더라도 그의 시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리라. 빼어난 언어감각으로 차려진 정갈한 소찬을 앞에 두고 나는 먼저 찬물에 두 손을 씻는다. 그의 꼿꼿하고 어진 심성의 눈매가 떠올린 시안(詩眼) 앞에 박수를 보낸다.
- 김신용(시인)
■ 책속에서
오늘도 나는 까마득한 절벽으로 출근을 한다
아찔한 공중에서 꽃 피우는 나무처럼
십 층 이십 층 삼십 층
목숨을 밧줄 삼아 오르면
바람은 언제나 등 뒤에서 불어오고
마른 계절은 발밑에서 흔들리는데
가파를수록 푸르러지는 우리들의 갈증
바닥이 사라진 허공을
더듬더듬 손톱 끝으로 매달리면
불안은 나를 끌어주는 침묵의 힘줄
빈 몸으로 쓸고 가는 사막일지라도
끝내 저 벽을 덮을 것이라고
늘어지는 줄을 다시 당기면
수백 개의 해는 한꺼번에 떠서
이마에 절어드는 소금꽃 땀방울
우리의 노동은 끝나지 않고
막걸리 한 사발에 가쁜 숨 토해내면
아삼삼 두고 온 새끼들 눈에 팔랑거려
마디마디 무릎 세워
그 벽을 껴안았다
「소금꽃 담쟁이 어느 페인트공의 노래」 전문
소란스런 고요의 봄숲에서
본다 나무는 빈 가지를 한번 더 벌려
그늘을 비껴 세운다는 것
바람소리 물소리 나부끼는 햇살
송송 걸러 아직 눈뜨지 못한 풀꽃들에게
약으로 내어주는 일
풀꽃들 떨며 눈뜨는 시간에도
나무는, 기도하는 자세로 불면의 밤을 지킨다
옳지, 옳지 걸음마 어린애 어르듯
가슴으로 녹인 물방울 방울방울 내려주면
얼음새꽃 노루귀 바람꽃 애기괭이눈
시새움하듯 움찔움찔 일어서서
늦는 봄을 당겨 세운다
함께 부둥켜안고 겨울을 넘긴 자들은
안다 살을 에는 아픔을 견딘 나무가
가장 늦게 꽃을 피운다는 것을, 그러고 보면
지난가을 나무가 왜 낙엽공장을 차렸는지
알겠다 발 동동 혹여 싹 틔우지 못하는
풀벌레 없도록 옷 벗어 덮어주었던 것
나무는 나무의 몸으로 사랑을 익혔으니
우리 생 헐벗은 빈 몸일지라도
가난도 나누면 온기가 된다는 뜻일까
하늘의 때를 알아 온몸으로
푸른 그늘을 펼쳐드는 일 또한
나무의 사랑법, 나는
나무의 필체로 받아 적는다
- 「나무의 사랑법」 전문
누군가 있다
어둠을 목에 두르고
가장 깊은 밤의 고요를 걷다 보면
학의천 물바닥을
지피는 불빛들의 분주한
검은 손들
물방울 돋는 우듬지
부풀어 오른 푸른 정맥이
밤새 퍼 올리는 물의 낙차
그 발전기의 힘으로
버들가지 산수유 개나리 벚나무
천지간 툭, 툭 꽃등이 켜진다는 것
깜박깜박 졸음을 터는 눈동자들
멈추지 않는 노동의
보이지 않는 등 뒤에서
불면의 밤을 연주하는
뜬 눈의 수천 손들
찌릿찌릿 나의 온몸을 감전하는
봄밤에는
누군가 있다
- 「봄밤에는 누군가」 전문
이것은 북, 두드리면 우는 북
먼 산을 바라보던 눈물 자작한 소였으니
죽음을 빌어 북북 몸을 찢어
피와 울음 말렸으니
자, 두드려볼까
거친 숨소리 몰아, 둥둥
함부로 울었던 저녁놀
오래 앓아온 그리움
눈물도 마르면 소금이 될까
설움에 노래를 석박아 목울대 넘기면
훤히 보이네, 굽은 등으로 일어서는 산과
아버지 밟아 가신 휘어진 강벼랑과
하늘도 들이받지 못하는 나는
황사바람 뒤덮는 빈 들녘을 되새김하는
그렁한 눈의 황소였을까
들썩이는 강물처럼
그리운 이름 호명하며 걷는 나는,
내 그림자에 밟혀 우는 북인가
- 「우는 북」 전문
담장을 기어오르다 멈춰버린
겨울 장미는
울컥울컥 자라던
벼락의 빗금이다
화석의 몸으로 피어난
전율하는 침묵이다
꽃을 토해내던
뱀의 혓바닥
하늘을 핥는
단단히 굳은 바람의 심장이다
뒤집어쓴 눈발 속에서
쿵쿵 얼음길을 뚫는
네 발로 우는 짐승이다
- 「겨울 장미를 위한 서설」 전문
■ 차례
제1부 뜬 눈의 수천 손들
거미의 집/ 봄밤에는 누군가/ 은빛 멸치/ 우는 북/ 초록 산책/ 제주 뒤란/ 우는 돌을 보았다/ 볼트를 주워들고/ 뭉크 이후 -실직시대/ 햇살 사다리/ 독도/ 다시 독도/ 구절초 핀다/ 겨울 장미를 위한 서설/ 수몰민 ―개구리밥풀
제2부 푸른 그늘을 펼쳐드는
수종사水鍾寺/ 그 바다의 뒷모습/ 서산 마애불 앞에서/ 달팽이는 밤을 건넌다/ 제비를 뽑으며/ 달빛 고요/ 둥굴레 꽃하늘/ 나무의 사랑법/ 나비의 항구/ 객지밥/ 고드름/ 비碑/ 냉이꽃 핀다/ 수수밭에 내리는 비는/ 새가 죽었다
제3부 햇살이 쓸고 가는
먼먼 고향/ 수국, 그 여자/ 숟가락별/ 하늘 책장/ 태양이 목구멍으로 뜨는 날은/ 소금꽃 담쟁이 ―어느 페인트공의 노래/ 목련꽃 그늘 너머/ 밤꽃을 건너가는 짧은 몽상/ 너에게로 간다/ 돌을 모셔놓고/ 사라질 달터마을을 위하여/ 이슬, 반가사유/ 배추를 거두며/ 도서관 속의 산푸른부전나비/ 푸른 도시
제4부 귀 낮은 풀벌레 소리
섬에서 띄우는 편지/ 금계리에서의 일박/ 티티카카 가시연/ 민들레처럼/ 봄맞이꽃/ 감자바우 사람들/ 초롱이끼들/ 나는 가끔씩 돼지를 꿈꾼다/ 도마에 생선을 눕혀놓고/ 재래시장의 갯벌/ 절두부처/ 광화문, 첫눈, 2016/ 그대, 슬픔에게/ 오후 3시의 그리움/ 강
■ 시인의 말
아픔을 딛고 이 땅을 살아가는 꽃들에게
나의 토막말들이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이 될 수 있다면,
젖은 눈으로 오는 매화 그늘에서
김이담
■ 시인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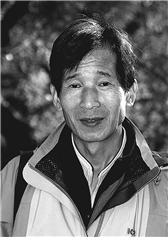
김이담 시인
충북 보은에서 태어났다. 2019년 계간 ≪가온문학≫ 봄호 ‘가온이 발굴한 시인’에 「그 바다의 뒷모습」 등을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노동현장에서 밥을 빌며 세월을 파먹었으나 시는 나의 운명, 다시 내게로 왔다. 이 땅의 가난하고 높고 쓸쓸한 사람들의 호흡을 그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동맥문학> 시대를 지나 <글길문학>, <천수문학>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집 #김이담시인 #김이담 #그벽을껴안았다 #가온문학 #동맥문학 #글길문학 #천수문학 #첫시집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중.소상공인의 놀이터 미디어테크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 미디어테크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이 한자리에 모여있습니다. 고객의 삶에 빛과 소금이되는 미디어테크는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는 제품으로 고객의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media-tech.kr
'도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상협 선배로부터 온 선물 _ '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 (0) | 2022.11.02 |
|---|---|
| 시 밥주는 여자 장용자 작가의 디카시 '오늘이 기록 중입니다' (0) | 2022.10.21 |
| [시 밥주는 여자] 장용자 시인의 디카시 "초심" (0) | 2022.01.22 |
| 시 밥 주는 여자 장용자 작가에게 선물 받은 따끈따근한 디카시집 "오늘이 기록 중입니다" (0) | 2022.01.21 |




